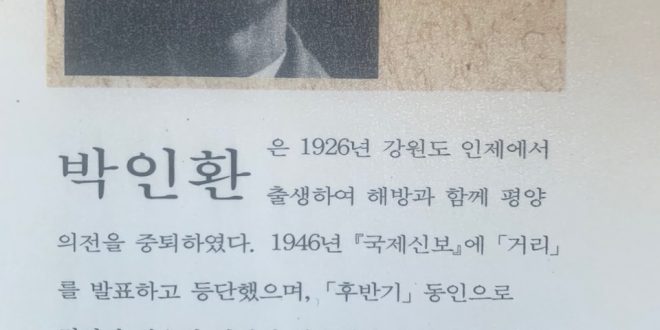박인환(1926~ 1956)이 썼다.
“시를 쓴다는 것은 내가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것이었다. 나는 지도자도 아니며, 정치가도 아닌 것을 잘 알면서 사회와 싸웠다”- 1955.
*출처: 목마와 숙녀/박인화, 미래사(1991). 책 앞머리에..
- 박인환(1926~1956)은 강원 인제 출생으로 경성제일고보를 거쳐 평양의전(平壤醫專) 중퇴, 종로에서 마리서사(書肆)라는 서점을 경영하면서 많은 시인들과 알게 되어 1946년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다. ‘거리’, ‘남풍(南風)’, ‘지하실(地下室)’ 등을 발표하는 한편 ‘아메리카 영화시론’을 비롯한 많은 영화평을 썼고 1949년에 김경린·김수영 등과 함께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을 간행하면서 모더니즘의 대열에 합류했다. 1955년 ‘박인환선시집’을 간행했고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번역하여 시공관에서 신협(新協)에 의해 공연되기도 했다.
인천항 – 박인환(1947)
사진잡지에서 본 향항(香港) 야경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중일전쟁 때 상해 부두를 슬퍼했다
서울에서 30킬로를 떨어진 곳에 모든 해안선과 공통되어 있는 인천항이 있다.
가난한 조선의 프로필을 여실히 표현한 인천 항구에는 상관(商館)도 없고 영사관도 없다.
따뜻한 황해의 바람이 생활의 도움이 되고자 냅킨 같은 만내(灣內)에 뛰어들었다.
해외에서 동포들이 고국을 찾아들 때 그들이 처음 상륙한 곳이 인천 항구이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은주(銀酒)와 아편과 호콩이 밀선에 실려오고 태평양을 건너 무역풍을 탄 칠면조가
인천항으로 나침을 돌렸다.
서울에서 모여든 모리배는 중국서 온 헐벗은 동포의 보따리같이 화폐의 큰 뭉치를 등지고 황혼의 부두를 방황했다.
밤이 가까울수록 성조기가 퍼덕이는 숙사와 주둔소의 네온사인은 붉고 정크의 불빛은 푸르며 마치 유니언잭이 날리던
식민지 향항의 야경을 닮아간다.
조선의 해항 인천의 부두가 중일전쟁 때 일본이 지배했던 상해의 밤을 소리 없이 닮아간다.
 부평위클리 THE BUPYEONG WEEKLY
부평위클리 THE BUPYEONG WEEKLY